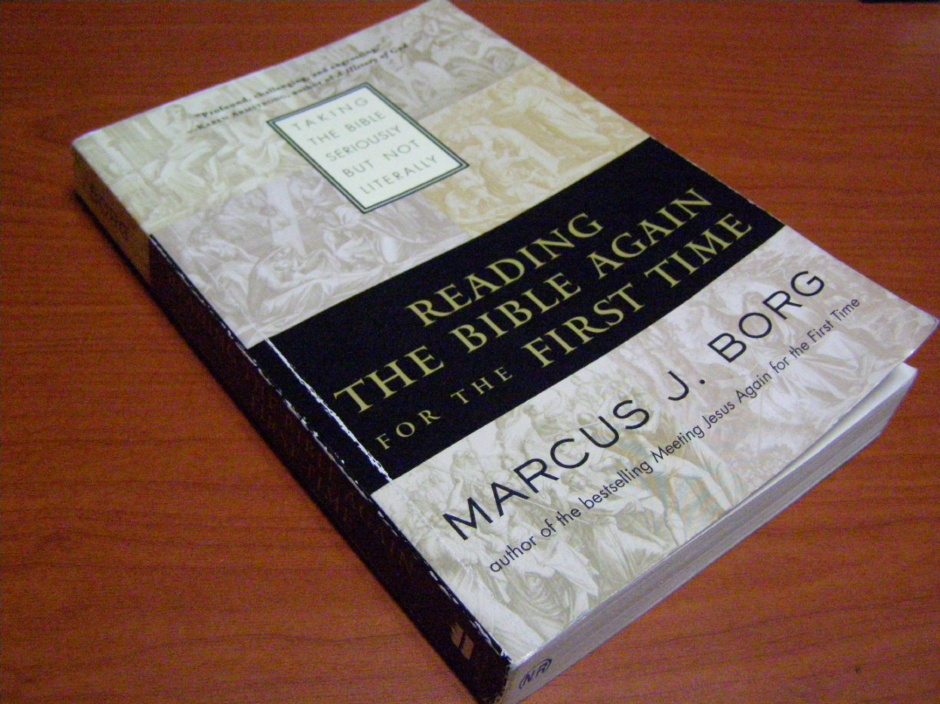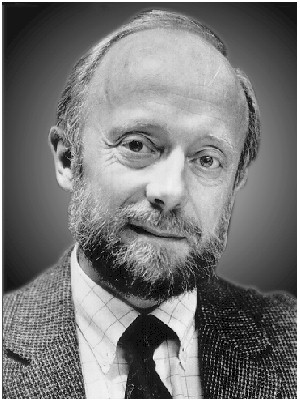Marcus J. Borg, Reading The Bible Again for the First Time: Taking the Bible Seriously but Not Literally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1)
(*책의 구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Reading the Bible Again for the First Time: Taking the Bible Seriously but Not Literally )
아직도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예를 들어 한 숟가락의 밥을 먹지 못해서 말라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뒷모습 위로 날아든 새까만 파리들에서 마치 지옥의 사자와 같은 섬뜩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볼 때, 그러한 시간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앞에서 ‘의미’를 찾고 혹은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족적이 아니었을까? 의미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숙명일 것이다.
아프간에서 납치되어 40여 일 동안이나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의 반응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반(反)기독교 정서와 기독교회 자체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노력을 보면서, 다시금 숙명적인 ‘의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쩌면 주변적이기만 했던 이러한 생각이 점차로 중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커스 보그(Marcus J. Borg)의 “성서 다시 읽기”(Reading the Bible Again for the First Time)을 읽으면서였다. 역사적 예수라는 신약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있는 저자는, 이제 완숙된 학문의 경륜을 사회에 되돌려주려는 위대한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고, 선물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의 말을 오용하는 사람들처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생각을 곡해하는 것에 우리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역지사지로,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읽고,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신학수업을 거치면서 내가 성서 이해에 있어서 ‘죄인 중의 괴수’였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해석을 신적권위로 포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서이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왔던 바를 책을 통해서 발견할 때의 기쁨과 아쉬움이란! 바로 이 책이 그렇다. 이 책은 성서이해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한다. 성서를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는 아기일 때만 해당된다. 아기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만 부모의 갈채를 받는다. 그러나 몇 십 년 동안 이것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식충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어떻게 읽는가를 통해서 ‘의미’를 얻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문자적 읽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위대한 출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대안으로 역사화된 내러티브로서의 성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성서에서 뉴스기사를 찾지 말고, 상상적인 은유와 강력한 이야기를 경험하라는 것이다(49). 그렇게 될 때, 히브리 성서(구약)에서 신약 성서까지 어우르는 ‘하나님의 꿈’을 맞보고 도전받으며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성서는 그 시대의 현실을 개혁하는 도전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사회 조직은, 그것이 바로 왕의 보좌이건 로마 황제의 흉상이건, 심지어 이스라엘 자신들의 제국이건 상관없이 무너져야만 한다. 바로 이 일을 성서는 도전한다(299ff). 히브리 성서의 방대함을 선택적으로 압축하는 것은 아쉬움이자 곧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특별히 지혜 문학의 탁월한 해석은 간단명료하면서 실제적이고 신학적이었다(179). 신약 이해의 통찰력 역시 큰 도움을 얻었다. 특별히 예수를 이해한 바울의 의미와 나름 방대한 분량을 주면서까지 선택한 계시록의 해석은 저자의 신학의 정수인 것 같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몸의 부활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N. T. Wright가 간간히 언급했던 반(反)제국적 신학이 바로 보그에게서 구체화된 것 같다).
저자는 ‘의미’를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의미에 백 번 동감한다. 저자는 기적을 ‘의미’의 차원에서 해석한다(206-18). 그러나 동시에 저자는 신적인 것(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의 경험을 강조한다(256). 마지막에 저자는 성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연민(나는 이를 히브리어 Hesed&Emet로 생각한다)”을 실체화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300). 저자에 의해서, 성서가 ‘가리키는 손’(a finger point)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번역해 보고픈 책이다.
마지막으로 어제있었던(9월 6일)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정회장에게서 다윗왕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죄의 대가로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도록 빌며, 놀라운 은혜는 허락된다(14,15절). 그 결과 이스라엘 전국에서 70,000명이나 죽음을 당했다. (마치 지금도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비정규직 아빠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역시 무리일까?) 이에 다윗은 국민적 원망을 추스리기라도 할려는듯 달랑 은 50세겔로(24절) 당시 그 지역의 왕, 즉 '아라우나'(후리어로 '왕'이라는 직함이다; Gordon 1997: 205)의 영토를 '빼앗는다(16,23절).' 더욱 놀라운 점은 성서와 오늘의 언론이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성서는 다윗을 옹호한다(이는 역대기 평행본문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일부 일간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을 두고 사설 하나도 싣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언론이 더 지혜롭다. 다윗의 시가 차곡차곡 쌓여 애창되었듯이, 정회장의 강연록이 얼마지나지 않아 베스트셀러라도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Culture > [독서] 좋은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철구. [역사와 이데올로기(2004)] (0) | 2007.09.14 |
|---|---|
|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2007)] (0) | 2007.09.09 |
|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2005)] (0) | 2007.08.31 |
|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 (0) | 2007.08.24 |
| Cyrus H. Gordon & Gary A. Rendsburg, The Bible & the Ancient Near East (0) | 2007.08.21 |